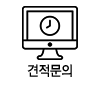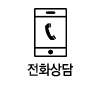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미술 인문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여행에서 모아 둔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 7개국 미술관의 대표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번 편은 오르세 미술관의 에두아르 마네의 예술 세계를 소개합니다. <기자말>
[김상래 기자]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마음 속으로 묻지요.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대부분의 순간, 세상이 비웃을까 두려워 확신보다 망설임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러나 미술사에는 그 두려움을 뚫고 걸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 에두아르 마네는 선택
게임몰 의 순간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눈을 믿은 화가였습니다. 고전의 안전한 틀 속으로 숨지 않고 모두가 외면하던 현실의 얼굴을 그림 속으로 끌어올렸지요.
저 역시 그 선택이 어떻게 예술의 판도를 흔들었는지 실감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 5층에서 그 그림을 실물로 마주한 순간, 저는 교과서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을 받았습
백경릴게임 니다. 사진에서는 느껴지지 않던 단단한 기운.
마치 "당신은 지금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나요?"라고 묻는 듯한 직선의 눈빛. 한 사람이 세상 앞에서 선택한 태도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 자리에서 똑똑히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마네가 '근대 회화의 문을 연 화가'로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불리게 되었을까요?
▲ 오르세 미술관 전경 오르세 미술관 5층 인상주의 전시실 전경
릴게임
ⓒ Pixabay
거리의 삶을 들여다 본 화가
지난 여름 방문한 오르세 미술관. 아침의 밝은 빛이 강을 넘어 미술관 창가까지 번져옵니다. 오르세 미술관 5층은
바다이야기사이트 아침부터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벽 중앙에 걸린 <올랭피아> 앞에서는 이상하리 만큼 발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가라앉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숨을 고르지요.
150년 전, 이 작은 캔버스는 유럽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묻게 됩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그 질문의 출발점에는 한 청년 화가,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 가 있습니다.
1832년 파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 마네는 아버지가 원하는 법관의 길보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대가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해군학교 시험에 두 번 떨어진 뒤 그는 결국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바다보다 그림을 더 좋아한다고 말이지요.
루브르에서 그는 벨라스케스, 고야, 라파엘로의 화면 앞에 오래 머물며 배웠습니다. 거대한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물의 표정과 빛의 흔들림 속에서 '현대'라는 감각을 발견한 거지요. 마네가 젊음을 보내던 시절, 파리는 폭풍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망 남작의 도시 재개편으로 좁은 골목은 사라지고 넓은 대로가 열렸습니다. 철도역이 생기고 카페와 극장이 도시의 심장을 대신했지요. 바로 그 변화가 마네의 화폭에 새로운 리듬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신화보다 거리의 삶이 담긴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순간을 붙잡는 눈, <풀밭 위의 점심식사>와 <에밀 졸라의 초상>
▲ 풀밭위의 점심 식사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위의 점심 식사(1863), 유화(Oil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208 cm × 264.5 cm, 오르세 미술관, 파리
ⓒ 오르세미술관
오르세 미술관에서 <올랭피아>를 보기 전 반드시 앞에서 만나게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1863년 파리 사회를 뒤흔든 <풀밭 위의 점심식사>입니다. 두 남자는 양복을 차려 입고 풀밭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한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나체로 앉아 있습니다. 신화도 아니고 전설의 주인공도 아닌 동시대 파리의 실제 사람들이 이런 구도로 등장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당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옷을 입은 남자 사이에 나체의 여자가 있는 거지?"
이 질문은 결국 마네가 던진 근대 회화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마네는 더 이상 신화 속 완벽한 아름다움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 우리의 시대"를 그려야 한다고 믿었고 이 그림은 그가 고전의 틀과 결별하는 첫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마네는 그림을 아주 매끈하게 다듬지 않았습니다. 피부나 옷자락을 자세히 보면 붓이 스치고 지나간 선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인물이 어떤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꾸며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솔직하게 화면에 앉혀 놓은 느낌입니다. 이 솔직함이 바로 마네를 낡은 틀 밖으로 밀어 올린 힘이었지요.
▲ 에밀졸라의 초상 에두아르 마네의 〈에밀 졸라의 초상〉(1868), 캔버스에 유채, 146 × 114 cm, 오르세미술관
ⓒ 오르세미술관
그 뒤 전시실에 걸린 <에밀 졸라의 초상>(1868)을 보면 마네가 어떤 정신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당시 마네는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었고 젊은 소설가 에밀 졸라는 그의 편에 섰습니다. 졸라는 신문 지면에 "마네는 현대를 그리는 진짜 화가"라고 공개적으로 옹호했지요. 이 초상화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네가 졸라에게 바친 작품입니다.
졸라는 검은 양복을 입고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그 뒤 벽에 붙어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왼쪽에는 <올랭피아>의 작은 판화가 있고, 그 위에는 마네가 존경했던 벨라스케스의 <바쿠스의 승리> 흑백 복제판이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당시 파리에서 큰 인기를 끌던 일본 우키요에(Ukiyo-e)가 보이는데, 우타가와 쿠니요시(Utagawa Kuniyoshi)가 그린 배우, 영웅 그림입니다. 이 세 작품은 졸라가 어떤 예술을 사랑했는지, 또 마네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작은 단서들이지요.
즉, 이 한 장의 초상화 안에는 "마네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지향하며, 누가 그의 편이었는가"가 모두 담겨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에밀 졸라의 초상>은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마네의 예술관을 요약한 작품이며 오르세 미술관에서 <올랭피아>로 이어지는 미술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중요한 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5년, 세상을 흔든 작품이 등장합니다. 오르세 미술관 5층에 걸린 <올랭피아>로 말이지요.
한 장의 시선이 바꾼 세계
▲ 올랭피아 에두아르 마네, 〈올랭피아〉(1863), 캔버스에 유채, 130.5 × 190 cm, 오르세 미술관
ⓒ 오르세미술관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전통적 누드화는 시선을 피하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올랭피아는 관람자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합니다. 마치 당신이 나를 보듯 나도 당신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요. 발치의 검은 고양이는 충성을 상징하던 개와 달리 당시 파리에서 '독립' 혹은 '불편함'을 의미하는 존재였습니다. 건네는 꽃다발은 누군가의 방문을 암시하지만, 올랭피아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남성의 시선을 중심으로 짜인 전통적 누드의 구조를 거부하는 몸짓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1865년 파리 살롱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욕설, 조롱, 우산으로 그림을 찌르려는 관람객. 결국 경찰이 그림 앞에 철창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전통적인 누드화에서는 여인을 비너스나 님프 같은 신화 속 존재로 꾸며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람자가 '실제 여성의 몸을 바라본다'는 부담 없이, 마치 신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자연스레 시선을 둘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올랭피아>는 실제 파리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아름다움의 전통'을 흔들어버렸고, 그 흔들림이 바로 현대 미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네는 고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화폭 위로 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네·드가·르누아르 같은 인상주의자들에게 이어져 오늘 우리가 보는 '현대 미술'의 출발점이 되었지요. 예술은 언제나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 한 시대의 눈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마네의 그림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나요?"
덧붙이는 글
 http://53.cia367.com
0회 연결
http://53.cia367.com
0회 연결
 http://54.cia954.net
0회 연결
http://54.cia954.net
0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