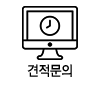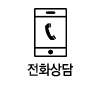고경명 영정
-장원급제하다
금산 전투에서 둘째 아들 인후와 함께 순국한 의병장 고경명(高敬命, 1533-1592), 1533년(중종 28) 광주 남구 압촌동에서 태어난다.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 본관은 장흥이며, 시호는 충렬이다.
장흥 고씨의 주 세거지는 영광이었다. 고조부인 고자검 때 광주 압촌동으로 이사오면서 광주 사람이 된다. 조부는 형조좌랑을 지낸 고운이고, 부친은 사간원 대사간을 지낸 고맹영이며 모친은 남평 서씨다. 부인은 장성 출신인 울산 김씨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김백균의 딸이다.
고경명은 남평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백인걸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 1552년(명종 7) 진사시에, 1558년(명종 13) 문과에 장원급제한다. 고경명을 모신 포충사 유물관인 ‘정기관’에 그의 장원급제 교지가 전시돼 있다.
온라인릴게임
포충사 전경
장원급제한 고경명이 받은 첫 관직은 정6품 성균관 전적이었다. 이어 호조좌랑, 세자시강원 설서를 거쳐 사간원 정언과 헌납을 지낸다. 이후 홍문과 수찬, 부교리를 거친 후 1563년(명종 18), 종5품 홍문관 교리
골드몽게임 를 지낸다. 장원급제 5년 만이었다.
1563년(명종 18), 승승장구하던 고경명은 울산군수로 좌천됐다가 파직된다. 명종의 비 인순왕후의 외삼촌인 이량(李樑)의 당으로 몰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581년(선조 10), 영암군수로 다시 등용된다. 울산 군수에서 파직된 후 18년 만이었다.
-이량의 당
백경게임 (黨)으로 파직되다 명종 대는 외척이 권세를 누리던 시대였다. 인종이 즉위하자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이 권력을 쥔다. 1년도 안 돼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명종의 모친 문정왕후의 오라버니 윤원형이 권력을 장악한다. 명종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왕비인 인순왕후의 외삼촌 이량을 등용한다. 명종 대는 외척 윤원형과 이량의 당이 아니면 요직으로 올라갈
릴게임바다이야기 수 없었다. 고경명이 장원급제한 후 관직에 나아갔을 때의 상황이 이랬다.
고경명의 부친 고맹영과 장인 김백균은 문과에 급제한 후 중앙 정계에 진출, 이량과 돈독한 사이었다. 그런데 1563년(명종 18), 홍문관 부제학 기대항 등이 이량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다. 이날, 홍문관 교리였던 고경명은 기대항이 이량을 탄핵하는 상소를 기초할 때 참여한 뒤 몰래 김백균에게 이 사실을 편지로 알렸고, 김백균은 이량에게 누설한다.
기대항 등의 상소로 이량이 탄핵되자, 장인을 통해 이량에게 알린 고경명은 울산 군수로 좌천된 후 파직된다.
고경명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울산 군수로 좌천된 후 파직되는 모습이 ‘선조실록’에 나온다. “울산 군수 고경명은 앞서 간인(姦人)들을 제거하던 날에 옥당(玉堂, 홍문관)에 있으면서 대의(大議)에 참여하였으니, 의당 조심하여 누설하지 않았어야할 터인데, 마음 씀이 반복무상(反覆無常, 말이나 행동이 일정하지 않음)하여 장인 김백균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내어 이량에게 전하도록 하였으니 지극히 간휼(奸譎)합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헌부는 이량 일당을 ‘간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량을 축출하기 위해 상소를 작성한 기대항 등의 행위를 ‘대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경명은 대의를 저버리고 간인들과 은밀히 밀통(密通)했다는 죄목이었다. 고경명의 나이 31살, 관직에 나아간 지 5년 만이었다.
홍문과 부제학 기대항의 상소에 이어 사헌부·사간원에서도 합세해 이량과 6간(奸)으로 지목된 일당에게도 중벌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선조실록’에는 ‘6간’으로 지칭된 명단 중에 고경명의 부친 고맹영과 장인 김백균도 포함돼 있었다. 고맹영과 김백균에 대해 ‘선조실록’에는 “이량에게 아첨해 종이 상전을 섬기듯 하였고”라고 기록할 정도였다. 고맹영과 김백균은 유배에 처해졌고, 고맹영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다.
1563년, 이량의 탄핵 시 몰래 기밀을 빼내 알린 사건은, 고경명에게는 ‘대의’를 배반하고 ‘간인’을 도운 사건으로 기록되면서 흑역사가 된다. “아비 고맹영, 장인 김백균과 함께 이량을 섬겨 청현직을 얻었다”라는 사관의 비아냥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18년간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 다시 관직에 나아가다 그의 관직 복귀는 18년이나 걸렸다. 그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책을 읽고 시를 짓는다. 무등산 자락의 면앙정과 식영정에 들러 면앙정 송순, 석천 임억령, 송강 정철, 고봉 기대승, 소쇄옹 양산보, 서하당 김성원 등과 교류하며, 시적 재능을 발휘한다.
‘면앙정삼십영’과 ‘식영정이십영’은 그가 남긴 시인의 흔적이다. 그는 정철, 임억령, 김성원 등과 함께 ‘식영정 4선’으로도 불렸다. 백사 이항복은 고경명을 “호남에 시인이 많다고들 하지만 그 가운데 제봉(고경명)이 가장 뛰어나다”고 극찬했다.
그가 무등산을 오르고 남긴 옛 선인들의 산행기 가운데 백미로 꼽는 ‘유서석록’을 남긴 것도 이 무렵이었다.
고경명은 1581년(선조 14) 울산 군수에서 파직된 지 18년 만에 영암 군수에 재임용된다. 그리고 이듬해 서산 군수 시절, 그는 이성계가 이자춘이 아닌 이인임의 아들로 잘못 기록된 명(明)나라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종계변무주청사 김계휘가 명에 파견될 때, 이이의 추천을 받아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다.
명에 다녀온 후 종부시 첨정을 비롯 사섬시 첨정, 평양서윤, 군자감정, 순창군수에 임명된다. 종부시(宗簿寺)는 왕실의 계보인 선원보첩(璿源譜牒)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는 관청이었고, 사섬시(司贍寺)는 저화(楮貨)의 주조 및 외거노비의 공포(貢布)에 관한 업무를, 군자감(軍資監)은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청이었다. 장원급제 후 그가 근무한 사헌부, 홍문관 등 청요직과는 거리가 먼 한직이었다.
1590년(선조 23), 그가 마지막 받은 관직은 정3품 승문원 판교에 이어, 받은 동래부사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년 전이었다.
그는 1년 만에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동래부사에서도 파직당한다.
‘선조실록’은 이유를 “고경명은 천성이 본시 소탈하여 도임한 이후로 책임의 중대함은 생각지 않고 날마다 술 마시는 것을 일로 삼아 직무를 전폐하고 있습니다”라고 ‘술’을 핑계로 삼았지만, 이는 동인인 집권한 후 서인의 거두 좌의정 정철이 논죄되면서, 고경명이 정철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고경명이 동래가 아닌 광주 고향집에서 임진왜란을 맞게 된 연유다.
고경명 기마상(광주 월드컵경기장 북문 옆 공원)
- 금산전투에서 순절하다
“근자에 국운이 불길하여 섬 오랑캐가 불시에 침입하였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약속한 맹세를 저버리더니 나중에는 통째로 집어삼킬 야망을 품었다. 우리의 국방이 튼튼치 못한 틈을 타서 기어들어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북상하고 있다.…고경명은 비록 늙은 선비지만 나라에 바치려는 일편단심만은 그대로 남아 있어 스스로 의로운 절개를 지키려 한다. 한갓 나라를 위하려는 성의만 품었을 뿐, 자기 힘이 너무나 보잘 것 없음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제 의병을 규합하여 곧장 서울로 진군하려 한다.…아, 각 고을 수령들과 각 지방의 인사들이여! 어찌 나라를 잊어버리랴? 마땅히 목숨을 저버릴 것이다. 혹은 무기를 제공하고 혹은 군량으로 도와주며, 혹은 말을 달려 선봉에 나서고, 흑은 쟁기를 버리고 논밭에서 떨쳐 일어서라! 힘닿는 대로 모두 다 정의를 위하여 나선다면 우리나라를 위험 속에서 구해 낼 것인바, 나는 그대들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할 것이다.”
1592년(선조 25) 6월, 북상하던 고경명 의병은 전주에 이르러 관군이 임진강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6월24일 각도의 수령과 백성, 군인들에게 격문을 보낸다. 이것이 말 위에서 쓴 그 유명한 ‘마상격문’(馬上檄文)이다. 이 격문은 당시 식자층을 감동시켰고, 호남의 열혈남아들을 고경명 휘하로 결집시킨다. 식자들의 심금을 울린 이 격문을 후대의 사람들은 최치원의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이나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에 비견되는 명문으로 평가한다.
말 위에서 쓴 ‘마상격문’(포충사 정기관 내)
1592년(선조 25) 5월29일, 고경명을 비롯한 안영·유팽로·양대박 등 21개 지역의 유생들이 군사를 이끌고 담양의 추성관(현 담양동초등학교)에 모인다. 이 회합에서 고경명은 의병장으로 추대된다. 그는 단 위에 올라 늙고 병들었음에도 대장이 되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다. 당시 그의 나이 60세였다.
고경명이 의병장에 추대되자 전라도 각지에서 6천여 의병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고경명 의병은 임금을 구하기 위해 북상 중 호남에 침입한 왜적을 먼저 몰아내기 위해 금산의 왜군을 공격한다. 하지만 1592년 7월10일, 왜적의 공세에 패퇴하면서 둘째 아들 인후와 함께 순절한다. 거병한 지 한 달여 만이었다.
-‘포충’(褒忠)을 사액받다
1871년(고종 8) 전국의 서원과 사당이 철폐될 때 남도에서 훼철되지 않고 살아남은 곳은 장성 필암서원과 광주의 포충사다. 필암서원은 종묘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를, 포충사는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의병장 고경명을 모신 사당이다. 그러나 포충사에는 고경명뿐만 아니라 두 아들인 종후·인후와 부장이었던 유팽로·안영도 함께 모셔져 있다.
포충사 사당
고경명과 두 아들의 위패를 모신 포충사는 1601년(선조 34) 건립되고, 1603년(선조 36) ‘포충’(褒忠)을 사액 받는다.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포충사 ‘정기관’(正氣館)에는 그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고경명은 이미 살핀 것처럼, 말안장에 앉아 쓴 격문과 격전을 독려하는 글을 쓴다. 그 글들을 모아 만든 책이 ‘정기록’이다.
고경명의 ‘마상격문’과 장원급제 교지, 목판 493장이 보존돼 있는 유물관이 정기관이 된 이유다.
정기관 입구에는 고경명의 친필 좌우명인 ‘세독충정’(世篤忠貞)이 걸려 있다. 세독충정은 ‘서경’에 나오는 말로, ‘대대로 독실하게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이 가훈은 두 아들이 실천했고, 지리산 연곡사에서 순국한 한말 의병장 고광순 의병장으로 이어진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
 http://75.cia948.com
0회 연결
http://75.cia948.com
0회 연결
 http://66.cia351.com
0회 연결
http://66.cia351.com
0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