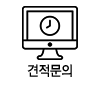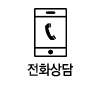밍키넷 23.kissjav.life ヶ 밍키넷 주소ウ 무료야동사이트リ
 >
>- 포트폴리오 >
- [복사본] 인테리어뉴스
밍키넷 23.kissjav.life ヶ 밍키넷 주소ウ 무료야동사이트リ
 >
>- 포트폴리오 >
- [복사본] 인테리어뉴스
관련링크
-
 http://28.kissjav.life
0회 연결
http://28.kissjav.life
0회 연결
-
 http://81.kissjav.help
0회 연결
http://81.kissjav.help
0회 연결
본문
밍키넷 42.kissjav.me セ 밍키넷 주소찾기ヤ 밍키넷 최신주소ピ 무료야동ア 밍키넷 검증ユ 밍키넷ム 밍키넷 새주소モ 밍키넷 주소ゼ 밍키넷 같은 사이트ィ 밍키넷 같은 사이트ゴ 밍키넷ザ 밍키넷 주소찾기ホ 밍키넷 검증リ 밍키넷ッ 밍키넷 트위터ュ 밍키넷ゾ 밍키넷 막힘ン 밍키넷 새주소ト 밍키넷 접속セ 밍키넷 새주소ズ 야동사이트ピ 밍키넷 트위터デ
2015년 6월 17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교회 중 하나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Emanuel AME Church) 수요예배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극단적 백인우월주의자인 21세 청년 딜런 루프(Dylann Storm Roof)가 “흑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총을 난사해 클레멘타 핀크니(Clementa C. Pinckney) 목사를 비롯한 9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9일 후, 찰스턴 시내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TD아레나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전통적인 흑인 감리교 예배 형식으로 치러진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사회의 오래된 흑백갈등에 관한 언급 대신, 뜬금없어 삼성캐피탈회사 보이는 ‘은혜(grace)’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증오에 눈이 먼 살인자는, 핀크니 목사와 성경공부 모임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 은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해집니다. 놀라운 은혜(Amazing gr 대출사기업체 ace)를….”
연설 도중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정지된 화면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도 긴장하며 침묵했습니다. 약 6초의 시간이었지만, 몇 시간이 된 듯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연설을 이어가는 중소기업대출비율 대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느닷없는 노래의 첫 소절이 채 끝나기도 전, 모든 청중들은 “와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오바마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그들이 은혜를 찾았다!”고 외쳤습니다. 아파트전세자금대출조건 그리고 “이제 은혜가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축복해주소서”라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오바마의 노래는 음악적으로 그리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나’와 ‘너’, ‘흑인’과 ‘백인’의 경계는 녹아내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 장면을 시청하던 나도 울컥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 할 정도로 오바마의 연설은 강렬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 문제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해결책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논리를 멈추고 노래했습니다. 그가 반복한 단어는 ‘레이스(인종·race)’가 아니라 ‘그레이스(은혜·grace)’였습니다. 놀라운 수사였습니다. 오바마의 ‘찰스턴 연설’은 21세기 최고의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연설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가 노래를 부르기 전 행했던 ‘6초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6초간의 침묵’. 21세기 최고의 연설로 꼽히는 오바마의 ‘찰스턴 연설’은 이 침묵 때문이었다. (AP=연합뉴스)
무대 위의 연주가 갑자기 모두 멈추는 ‘게네랄파우제(Generalpause)’
오바마의 ‘6초간 침묵’은 서양 음악에서 ‘게네랄파우제’라 불리는 아주 고전적인 기법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게네랄파우제는 연주하다가 모든 악기와 목소리가 동시에 멈추는 침묵 구간을 의미합니다. 게네랄파우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감동을 극대화한 대표적인 예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마지막 곡 ‘아멘(Amen)’의 끝부분입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각 성부가 ‘아멘’을 푸가 형식으로 경쟁적으로 질주하며 연주하다가 갑자기 모두 멈춥니다. 악보에 정적의 순간은 ‘온쉼표’와 ‘페르마타’로 표시돼 있습니다. 악보 기호상으로는 한마디를 쉬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휘자는 이 침묵을 통해 ‘청중의 호흡’을 음악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청중들의 호흡과 감정이 침묵하고 있는 연주의 빈 공간을 채웁니다. 청중의 정서적 반응이 연주되는 것입니다. 그 정적을 통해 음악은 연주자만의 몫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침묵이 끝나고 마지막 소절이 울려 퍼질 때, 연주자와 청중은 하나가 됩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연주자와 청중이 하나가 되는 감동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줍니다. 오바마의 연설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바마의 ‘6초간 침묵’이나 ‘게네랄파우제’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해석한다면 아주 훌륭한 ‘순서 바꾸기(turn-taking)’ 기법입니다. 연설이나 연주는 무대 위의 연설자나 연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청중과 끊임없이 ‘순서(turn)’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연설자나 연주자가 멈추는 순간은 청중에게 소통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신호입니다. 즉 청중에게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입니다’라고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헨델은 게네랄파우제로, 오바마는 6초간의 침묵으로 청중을 초대한 것입니다. 침묵 이후에는 연주자나 연설자, 그리고 청중이 모두 하나가 되는 경험, 즉 감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도올 김용옥의 강연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잉?’ ‘응?’ 하는 그의 ‘순서 바꾸기’ 기술 때문이다.
그 당시, 도올 김용옥의 강연이 특별했던 이유
강연이나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와 청중의 차례가 오가는 ‘순서 바꾸기’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훌륭한 연설이고 좋은 강연입니다. 2000년 TV 강연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도올 김용옥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방송에 출연했던 지식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말끝마다 특유의 쉰 소리로 ‘응?’ 또는 ‘잉?’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는 청중에게 ‘지금 내 이야기 다 이해하는 거지요?’ 하며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청중들에게 ‘당신들의 차례야!’라며 ‘순서 바꾸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은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칩니다.
김용옥 이전의 지식 강연에서 이 같은 방식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강연자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청중은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 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연은 상호작용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계몽과 교육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용옥은 아주 오래된 계몽과 교육의 일방적 소통 방식을 청중의 정서적 참여를 이끄는 ‘잉?’ 하는 충청도 사투리로 깨부순 것입니다. 당시 그의 TV 강연은 인기 연속극을 뛰어넘는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순서 바꾸기’는 의사소통 이론 안에서 아직 널리 알려진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주관성의 심리학적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앞서 살펴본 ‘터치’ ‘눈맞춤’ ‘정서 조율’이 신체적 감각을 통해 이뤄지는 초기적 상호주관성의 기제라면, 순서 바꾸기는 상징과 언어를 매개로 한 본격적인 상호주관적 소통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해도,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기분 상합니다. 더 불쾌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는 겁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주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잠깐의 성공은 가능하지만, 조직의 암 덩어리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순서 바꾸기’를 망가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순서 바꾸기’라는 현상에 처음 주목한 하비 색스. 흐린 흑백사진 몇 장 남기고 40세에 교통사고로 요절한 그는, 인간 언어를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주목하는 ‘대화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개척했다.
대화에서의 ‘순서 바꾸기’를 처음 주목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하비 색스(Harvey Sacks)입니다. 1960년대, 그는 당시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시작은 색스가 로스앤젤레스의 자살예방센터에 걸려온 전화 상담 녹취를 우연하게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 “음…” “제가…”와 같은 긴 침묵이 포함된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 형식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녹취해 아주 사소한 소리까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색스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울 만큼 질서 있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규칙 없이 잡담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언제 말을 시작하고 멈출지를 정확히 인지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조차 서로 약속한 듯 자연스럽게 조율돼, 대화가 어색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극 대사처럼, 보이지 않는 규칙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듯했습니다. 그 규칙은 때로 문법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색스는 동료인 이매뉴얼 셰글로프(Emanuel Schegloff)와 게일 제퍼슨(Gail Jefferson)과 함께 이 현상을 집요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미세한 억양과 멈춤과 시작을 알리는 ‘음’ ‘어’ ‘하하’와 같은 발화 단위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순서 바꾸기’를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세 사람은 10년 이상의 시간을 쌓여 있는 녹취록과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해 1974년 언어학 저널 ‘Language’에 ‘대화에서 순서 바꾸기를 조직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당시의 언어학은 문장을 ‘완결된 하나의 구조물’로 보고, 그 안의 문법과 어순, 그리고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언어는 한 개인의 생각이 표현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색스의 연구팀은 정반대의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로 보았습니다. 언어란 한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에 반응하며 순서와 리듬을 조율해가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어의 본질은 ‘문장’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의 리듬과 순서’에 있다는 통찰입니다.
색스와 동료들의 혁신적 언어 연구방법론은 이후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CA)’이라는 이름으로 정립됐습니다. 대화분석은 언어를 더 이상 고정된 기호체계로 보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해가는 실시간적 상호작용의 장으로 해석합니다. 순서 바꾸기 연구로 인해 언어 연구의 초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에서 ‘어떻게 말이 오가는가’로 바뀐 것이지요. 이 변화는 마치 천문학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전환된 것에 비견될 만큼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비 색스의 한 문장은 이 혁명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대화에는 어느 지점에서도 질서가 있다(order at all points).”
색스의 이 주장은 인간의 말하기가 결코 우연한 혼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칙과 조율 속에서 작동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연구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화분석은 언어학뿐 아니라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인공지능(AI) 연구까지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는가’라는 문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인간과 AI의 소통 방식과 관련해 대화분석의 연구 결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색스는 이 혁명적인 논문을 발표한 이듬해인 1975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합니다. 불과 40세의 나이였습니다. 천재는 매번 이렇게 일찍 요절합니다. 인간 언어와 사고에 관한 연구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능케 했던 러시아의 심리학자 비고츠키도 3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고츠키와 색스는 단지 짧은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만 공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언어를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율 행위’로 봤습니다. 비고츠키는 상호작용에서 생각이 탄생하고, 색스는 상호작용에서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봤습니다. 비고츠키의 ‘자기중심적 언어’처럼 색스의 ‘순서 바꾸기’는 인간 상호주관성의 기원에 관한 이론의 또 다른 혁명이 됩니다.
[김정운 문화심리학자·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32호 (2025.10.29~11.04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c) 매경AX.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9일 후, 찰스턴 시내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TD아레나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전통적인 흑인 감리교 예배 형식으로 치러진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사회의 오래된 흑백갈등에 관한 언급 대신, 뜬금없어 삼성캐피탈회사 보이는 ‘은혜(grace)’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증오에 눈이 먼 살인자는, 핀크니 목사와 성경공부 모임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 은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해집니다. 놀라운 은혜(Amazing gr 대출사기업체 ace)를….”
연설 도중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정지된 화면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도 긴장하며 침묵했습니다. 약 6초의 시간이었지만, 몇 시간이 된 듯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연설을 이어가는 중소기업대출비율 대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느닷없는 노래의 첫 소절이 채 끝나기도 전, 모든 청중들은 “와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오바마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그들이 은혜를 찾았다!”고 외쳤습니다. 아파트전세자금대출조건 그리고 “이제 은혜가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축복해주소서”라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오바마의 노래는 음악적으로 그리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나’와 ‘너’, ‘흑인’과 ‘백인’의 경계는 녹아내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 장면을 시청하던 나도 울컥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 할 정도로 오바마의 연설은 강렬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 문제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해결책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논리를 멈추고 노래했습니다. 그가 반복한 단어는 ‘레이스(인종·race)’가 아니라 ‘그레이스(은혜·grace)’였습니다. 놀라운 수사였습니다. 오바마의 ‘찰스턴 연설’은 21세기 최고의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연설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가 노래를 부르기 전 행했던 ‘6초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6초간의 침묵’. 21세기 최고의 연설로 꼽히는 오바마의 ‘찰스턴 연설’은 이 침묵 때문이었다. (AP=연합뉴스)
무대 위의 연주가 갑자기 모두 멈추는 ‘게네랄파우제(Generalpause)’
오바마의 ‘6초간 침묵’은 서양 음악에서 ‘게네랄파우제’라 불리는 아주 고전적인 기법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게네랄파우제는 연주하다가 모든 악기와 목소리가 동시에 멈추는 침묵 구간을 의미합니다. 게네랄파우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감동을 극대화한 대표적인 예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마지막 곡 ‘아멘(Amen)’의 끝부분입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각 성부가 ‘아멘’을 푸가 형식으로 경쟁적으로 질주하며 연주하다가 갑자기 모두 멈춥니다. 악보에 정적의 순간은 ‘온쉼표’와 ‘페르마타’로 표시돼 있습니다. 악보 기호상으로는 한마디를 쉬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휘자는 이 침묵을 통해 ‘청중의 호흡’을 음악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청중들의 호흡과 감정이 침묵하고 있는 연주의 빈 공간을 채웁니다. 청중의 정서적 반응이 연주되는 것입니다. 그 정적을 통해 음악은 연주자만의 몫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침묵이 끝나고 마지막 소절이 울려 퍼질 때, 연주자와 청중은 하나가 됩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연주자와 청중이 하나가 되는 감동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줍니다. 오바마의 연설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바마의 ‘6초간 침묵’이나 ‘게네랄파우제’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해석한다면 아주 훌륭한 ‘순서 바꾸기(turn-taking)’ 기법입니다. 연설이나 연주는 무대 위의 연설자나 연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청중과 끊임없이 ‘순서(turn)’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연설자나 연주자가 멈추는 순간은 청중에게 소통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신호입니다. 즉 청중에게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입니다’라고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헨델은 게네랄파우제로, 오바마는 6초간의 침묵으로 청중을 초대한 것입니다. 침묵 이후에는 연주자나 연설자, 그리고 청중이 모두 하나가 되는 경험, 즉 감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도올 김용옥의 강연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잉?’ ‘응?’ 하는 그의 ‘순서 바꾸기’ 기술 때문이다.
그 당시, 도올 김용옥의 강연이 특별했던 이유
강연이나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와 청중의 차례가 오가는 ‘순서 바꾸기’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훌륭한 연설이고 좋은 강연입니다. 2000년 TV 강연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도올 김용옥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방송에 출연했던 지식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말끝마다 특유의 쉰 소리로 ‘응?’ 또는 ‘잉?’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는 청중에게 ‘지금 내 이야기 다 이해하는 거지요?’ 하며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청중들에게 ‘당신들의 차례야!’라며 ‘순서 바꾸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은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칩니다.
김용옥 이전의 지식 강연에서 이 같은 방식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강연자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청중은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 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연은 상호작용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계몽과 교육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용옥은 아주 오래된 계몽과 교육의 일방적 소통 방식을 청중의 정서적 참여를 이끄는 ‘잉?’ 하는 충청도 사투리로 깨부순 것입니다. 당시 그의 TV 강연은 인기 연속극을 뛰어넘는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순서 바꾸기’는 의사소통 이론 안에서 아직 널리 알려진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주관성의 심리학적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앞서 살펴본 ‘터치’ ‘눈맞춤’ ‘정서 조율’이 신체적 감각을 통해 이뤄지는 초기적 상호주관성의 기제라면, 순서 바꾸기는 상징과 언어를 매개로 한 본격적인 상호주관적 소통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해도,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기분 상합니다. 더 불쾌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는 겁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주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잠깐의 성공은 가능하지만, 조직의 암 덩어리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순서 바꾸기’를 망가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순서 바꾸기’라는 현상에 처음 주목한 하비 색스. 흐린 흑백사진 몇 장 남기고 40세에 교통사고로 요절한 그는, 인간 언어를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주목하는 ‘대화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개척했다.
대화에서의 ‘순서 바꾸기’를 처음 주목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하비 색스(Harvey Sacks)입니다. 1960년대, 그는 당시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시작은 색스가 로스앤젤레스의 자살예방센터에 걸려온 전화 상담 녹취를 우연하게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 “음…” “제가…”와 같은 긴 침묵이 포함된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 형식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녹취해 아주 사소한 소리까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색스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울 만큼 질서 있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규칙 없이 잡담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언제 말을 시작하고 멈출지를 정확히 인지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조차 서로 약속한 듯 자연스럽게 조율돼, 대화가 어색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극 대사처럼, 보이지 않는 규칙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듯했습니다. 그 규칙은 때로 문법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색스는 동료인 이매뉴얼 셰글로프(Emanuel Schegloff)와 게일 제퍼슨(Gail Jefferson)과 함께 이 현상을 집요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미세한 억양과 멈춤과 시작을 알리는 ‘음’ ‘어’ ‘하하’와 같은 발화 단위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순서 바꾸기’를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세 사람은 10년 이상의 시간을 쌓여 있는 녹취록과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해 1974년 언어학 저널 ‘Language’에 ‘대화에서 순서 바꾸기를 조직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당시의 언어학은 문장을 ‘완결된 하나의 구조물’로 보고, 그 안의 문법과 어순, 그리고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언어는 한 개인의 생각이 표현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색스의 연구팀은 정반대의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로 보았습니다. 언어란 한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에 반응하며 순서와 리듬을 조율해가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어의 본질은 ‘문장’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의 리듬과 순서’에 있다는 통찰입니다.
색스와 동료들의 혁신적 언어 연구방법론은 이후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CA)’이라는 이름으로 정립됐습니다. 대화분석은 언어를 더 이상 고정된 기호체계로 보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해가는 실시간적 상호작용의 장으로 해석합니다. 순서 바꾸기 연구로 인해 언어 연구의 초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에서 ‘어떻게 말이 오가는가’로 바뀐 것이지요. 이 변화는 마치 천문학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전환된 것에 비견될 만큼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비 색스의 한 문장은 이 혁명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대화에는 어느 지점에서도 질서가 있다(order at all points).”
색스의 이 주장은 인간의 말하기가 결코 우연한 혼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칙과 조율 속에서 작동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연구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화분석은 언어학뿐 아니라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인공지능(AI) 연구까지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는가’라는 문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인간과 AI의 소통 방식과 관련해 대화분석의 연구 결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색스는 이 혁명적인 논문을 발표한 이듬해인 1975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합니다. 불과 40세의 나이였습니다. 천재는 매번 이렇게 일찍 요절합니다. 인간 언어와 사고에 관한 연구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능케 했던 러시아의 심리학자 비고츠키도 3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고츠키와 색스는 단지 짧은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만 공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언어를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율 행위’로 봤습니다. 비고츠키는 상호작용에서 생각이 탄생하고, 색스는 상호작용에서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봤습니다. 비고츠키의 ‘자기중심적 언어’처럼 색스의 ‘순서 바꾸기’는 인간 상호주관성의 기원에 관한 이론의 또 다른 혁명이 됩니다.
[김정운 문화심리학자·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32호 (2025.10.29~11.04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c) 매경AX.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